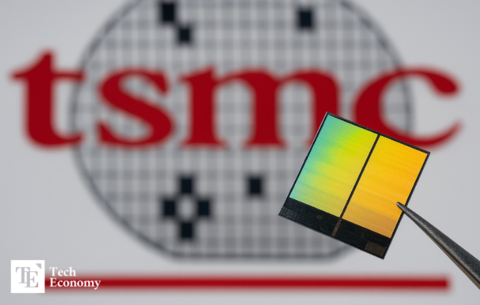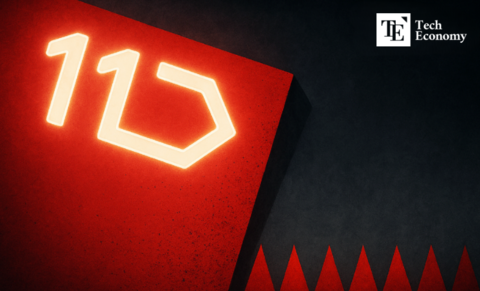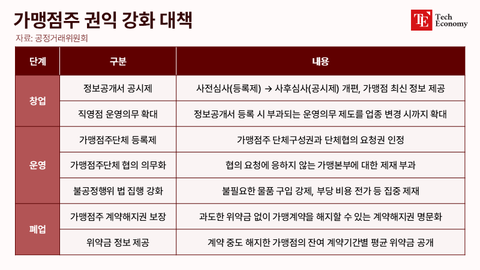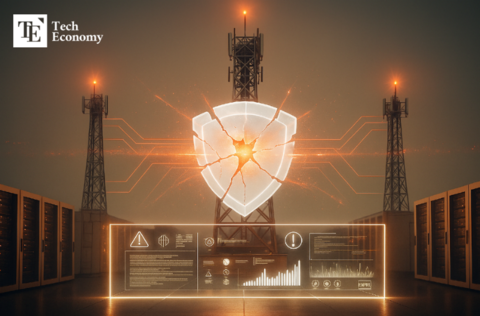포스코·일본제철 '철의 동맹’ 마무리 수순, 자국 철강 산업 위기 속 ‘각자도생’
입력
수정
포스코, 일본제철 지분 매각해 2,378억원 마련 일본제철도 지난해 포스코 지분 팔아 한일 철강업체 지분 동맹 종료 전망

포스코홀딩스가 반세기를 이어온 일본제철과의 '철의 동맹'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국 철강 산업의 초석을 다진 양사 간 역사적 협력이 지분 정리를 통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관계 정리를 두고 동맹 파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각자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이별로 해석한다. 양사 혈맹의 시대는 끝나고 각자 무기로 승부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포스코, 일본제철 지분 절반 블록딜 매각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전날 장 마감 이후 일본제철 보유 지분 약 1.5%(1,569만 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785만 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 매각가는 종가(3,222엔) 대비 1~2.5% 할인된 수준에서 진행됐으며, UBS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이번 거래 주관사를 맡았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블록딜을 통해 252억 엔(24일 환율 기준 약 2,378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될 전망이다. IB업계에선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일본제철 지분도 곧 블록딜로 처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잔여 지분까지 매각하면 한일의 대표적인 두 철강기업의 ‘지분 동맹’도 종료될 전망이다.
양사는 1998년 포스코 민영화 당시 서로의 주식을 취득하며 지분 관계를 맺었다. 이후 2006년 10월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일본제철 지분 1.5%를, 일본제철이 포스코홀딩스 지분 3.42%를 가졌다. 20여 년간 이어간 지분 동맹은 일본제철이 지난해 US스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균열이 생겼다. 일본제철은 당시 포스코홀딩스 지분 3.42%를 약 1조1,000억원에 처분했다.

한일 양국,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총력
일본 철강업계의 과도한 덤핑 판매도 양사 동맹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본 내수 열간압연강판 가격(달러 환산 월평균 환율)은 한국 수입가격 대비 평균 208달러(약 29만원) 높았다. 일본 철강업계가 자국 내수 가격 대비 평균 25.4%가량 낮은 가격으로 한국향 수출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일본 내수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998달러(약 140만원)를 기록했는데 당시 한국 수입 가격은 톤당 551달러(약 77만원)였다. 자국 가격 대비 톤당 44.8%나 낮은 가격에 밀어낸 셈이다. 지난해 일본 철강 가격 하락에 따라 내수 열연강판 가격과 한국향 수출 가격과의 격차는 좁혀졌으나, 여전히 평균 톤당 160달러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통상 해외 가격과 수출가격의 경우 1~2개월의 기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같은 가격 격차는 상식 밖의 결과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에 국내 2위 철강 기업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당초 현대제철은 중국산 제품만 제소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산 제품도 범람하자 양국 제품 모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누적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 톤으로 이 중 중국이 153만 톤, 일본은 177만 톤으로 전체 물량의 96%를 차지했다. 이후 일본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월 일본제철, 고베제철 및 기타 국내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수요 약화와 저렴한 수입품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공장 2곳 셧다운, 올해 하반기 1조원 현금 확보 목표
포스코가 일본제철 보유 지분을 정리한 또 다른 이유는 비핵심 자산 정리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반기에만 11건의 구조 개편을 마무리해 약 3,500억원의 현금을 창출했고, 올해 하반기에 약 1조원의 현금을 추가 확보해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일본의 저가 공세에 신음하고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글로벌 선재시장은 약 2억 톤(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수요는 0.9억 톤에 불과했다. 특히 1억4,00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에서 수요부족 및 가동 확보를 위해 저가로 한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면서 글로벌 선재가격 하락을 주도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에 대미 수출이 급감했고,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내수 수요마저 위축됐다. 이 때문에 포스코의 상징인 포항제철소는 1973년 설립 이후 51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다. 자동차용 강판 등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광양제철소와 달리 선재, 후판, 열연강판 등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인 포항제철소의 한계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5년이 한국 철강산업의 존폐를 가를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저부가 제품은 줄이고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를 확대하지 않으면 국내 철강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됐고, 이는 한국 철강사의 입지를 위협할 공산이 크다. 특히 포스코홀딩스와의 지분 정리가 이뤄진 시점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