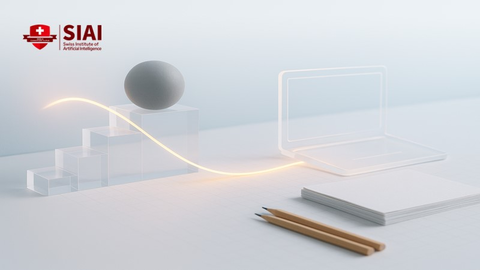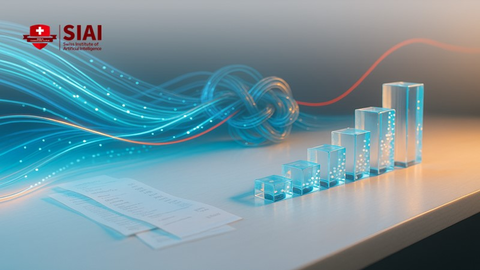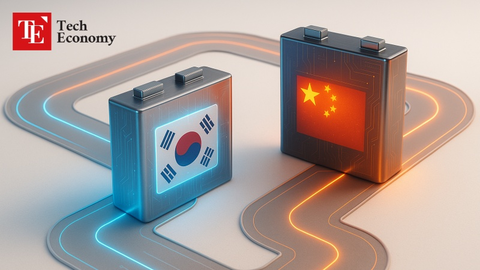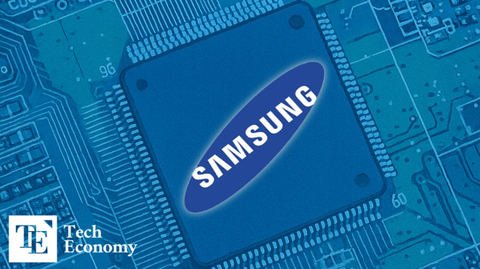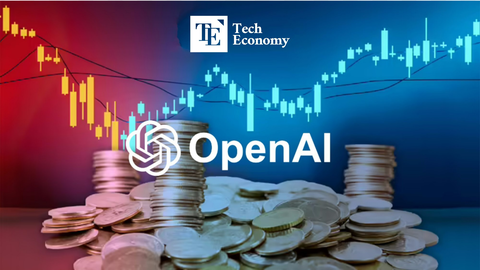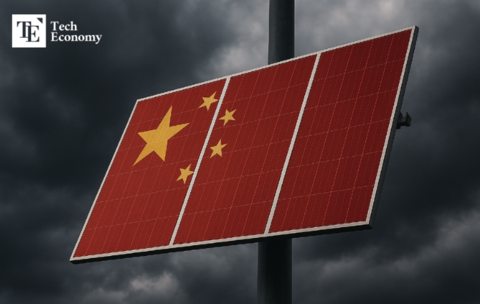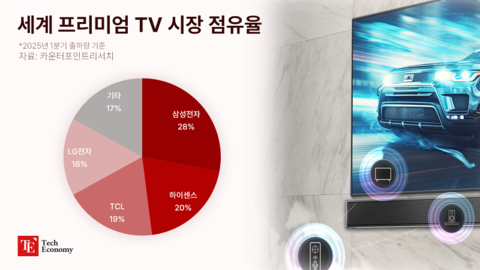"단순 챗봇 아니다" 자체적 생태계 구축하는 챗GPT
입력
수정
상업·공공 통합 플랫폼으로 변신한 챗GPT 전자상거래 내재화, 비영리 펀드 조성 통해 생태계 구축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 AI 산업이 마주한 갈림길

챗GPT의 개발사로 알려진 오픈AI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단순 '인공지능(AI)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상업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개자 없는 전자상거래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AI는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깊게 연결된 두 가지 발표를 내놨다. 첫째는 웹 브라우저와 각종 소프트웨어 도구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신형 AI 에이전트 모델의 출시이며, 둘째는 비영리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의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5,000만 달러(약 68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다. 겉으로 보기엔 각각 수익과 공익을 지향하는 듯한 행보지만, 사실상 두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동일하다. 바로 경제와 사회 양 측면에서 오픈AI의 영향력을 통합·확장하는 것이다.
오픈AI의 첫 번째 변화이자, 사업 측면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결정은 에이전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내부화다. 현재 챗GPT 프로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에 탑재된 해당 에이전트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스프레드시트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제품을 검색하고, 예약하며, 실제 구매를 실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픈AI는 기존의 제3자 쇼핑 제휴사들과의 연계를 줄이고, 자사 플랫폼 내에서 직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중이다. 사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상품을 결제할 경우 오픈AI는 거래당 일정 비율의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분석가는 “이것은 생성형 AI 업계의 애플 모델”이라며 “애플이 아이튠즈로 음악 판매를, 앱스토어로 앱 유통을 자사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였듯, 오픈AI도 상거래를 ‘폐쇄형 울타리(walled garden)’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평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수익 사슬(Value Chain)의 내부 집중화 전략이 챗GPT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오픈AI의 이 같은 행보는 향후 AI 업계는 물론 리테일 업계에도 유의미한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디지털 상거래 독점 구조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간섭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인프라와 영향력: 이중 전략
오픈AI는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 기술 인프라 구축자로서의 역할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챗GPT가 정보 탐색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디지털 거주지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자체 플랫폼 내부에서 처리 가능한 일이 늘어날수록 오픈AI는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 전반에서 더 많은 주도권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오픈AI는 ‘삶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for Life)’를 구축 중인 셈이다.
상업적 확장과 더불어, 오픈AI는 사회 기반 강화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성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펀드는 교육, 보건, 윤리적 AI 연구 등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및 지역 커뮤니티 기반 기관들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오픈AI 중심의 시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오픈AI의 도구를 채택하고, 그에 맞춰 자체적으로 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면 이들은 확장된 '오픈AI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된다. 오픈AI가 사회 전반에서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셈이다.
이번 펀드는 700만 명 이상을 대표하는 500여 개 단체들과의 심층 협의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논의는 오픈AI 산하 비영리위원회(Nonprofit Commission) 주도로 진행됐으며,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펀드의 구조와 우선 지원 분야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펀드 출범 당시 한 오픈AI 임원은 “우리는 단지 기술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며, 신뢰를 쌓고 싶다"며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시스템들과 함께 살아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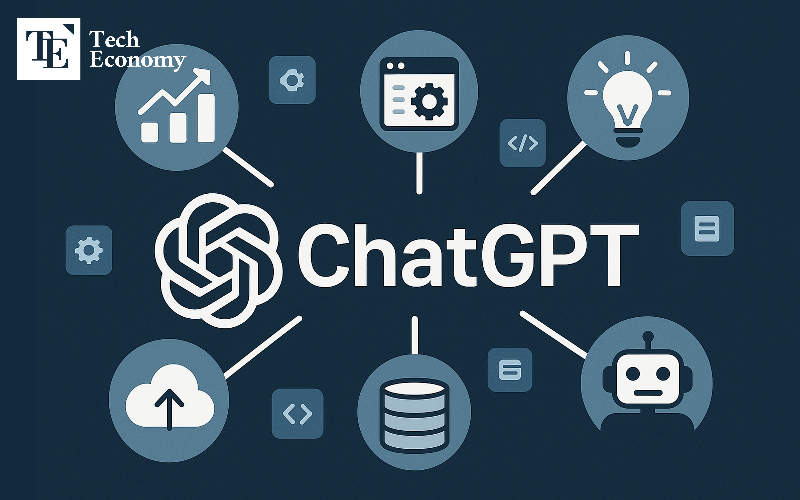
하나로 통합되는 단일 생태계?
AI 에이전트 모델과 비영리 펀드를 함께 놓고 보면, 오픈AI의 전략은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수렴된다. 경제적·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생태계를 내부화하는 것이다. 어시스턴트는 상업 인터페이스의 전면에 서는 역할을, 펀드는 시민 사회와의 접점 역할을 맡는다. 이 전략은 기존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확장 시나리오와 유사하다. 과거 구글은 검색과 광고로, 아마존은 물류와 클라우드로, 메타는 소셜 인프라로 자체 생태계를 확장했다. 다만 오픈AI의 생태계 통합 속도와 그 범위만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챗GPT는 불과 2년 만에 '신기한 서비스'에서 일상적 필수 도구로 진화했고, 이제는 하나의 어엿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픈AI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 집중이 경쟁 저해, 불투명한 수익화 구조, AI 서비스의 지나친 상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안전성 향상,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 책임 있는 확장 가능성 등 자체 생태계 구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오픈AI가 직면한 난제인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 딜레마가 한층 심화한 셈이다. 향후 챗GPT 서비스가 보여줄 변화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규정할 핵심 쟁점이자, AI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일종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