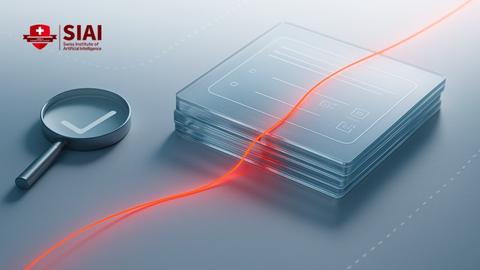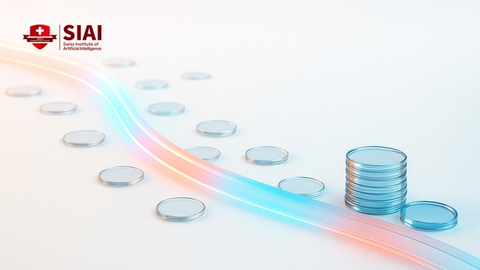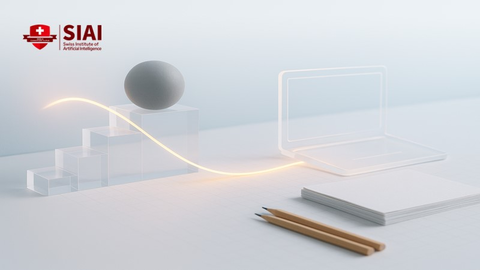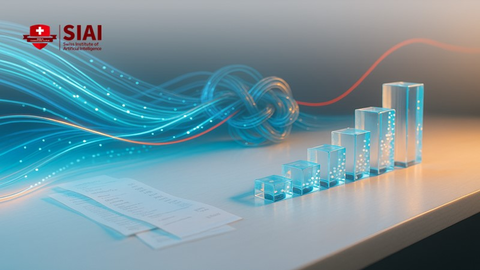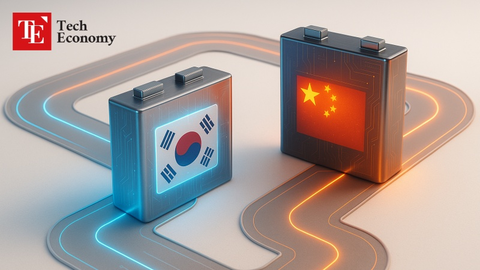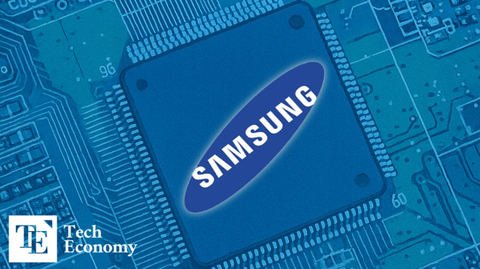화장품 산업 고성장 속 책임판매업자 줄폐업, 4년 새 10배 급증
입력
수정
지난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폐업 8,831건 줄폐업에 전체 책임판매업체 수도 역성장 아이디어만으로 하는 쉬운 창업에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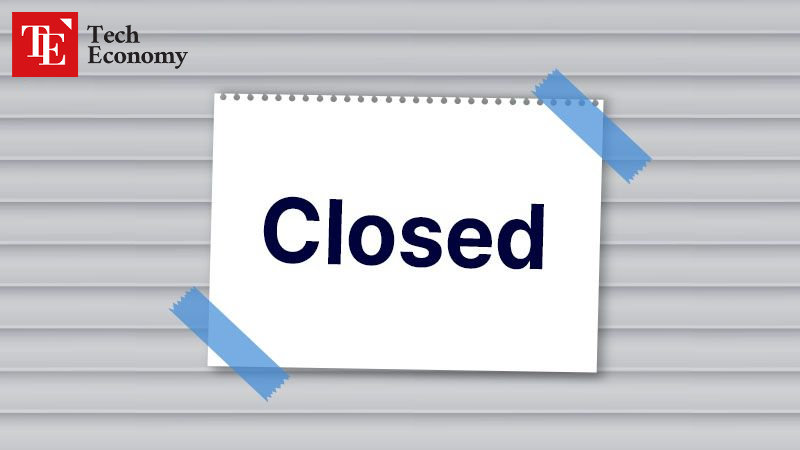
'K뷰티' 열풍에 편승해 화장품 유통·판매에 뛰어든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고, 폐업 업체 수와 폐업률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적은 자본과 경험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지면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신생 브랜드가 우후죽순 등장한 결과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창업자가 대거 진입하면서 허위광고, 품질 논란, 표절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폐업률 4년 새 5배 증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폐업은 8,831건으로 2020년(882건) 대비 10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업률은 5.6%에서 28%로 치솟았다. 폐업 업체는 △2020년 882건 △2021년 1,143건 △2022년 2,739건 △2023년 3,258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70.1%나 늘었다. 폐업이 속출하면서 전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책임판매업체는 2만7,361개로 전년(3만1,524개) 대비 13.2% 줄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는 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하는 한국 특유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제도다. 한국 화장품 시장은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 모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나의 법인이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체는 생산에 집중하고, 책임판매업체는 유통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구조로 이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업 구조는 자본이 적은 신생 기업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뷰티' 열풍에 인플루언서까지 창업에 나서
하지만 이런 구조는 책임판매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2010년대만 해도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을 통해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가 온라인 유통 채널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소 브랜드 창업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주부 등 개인 창업자는 물론, 화장품과 무관한 업종의 기업까지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신생 브랜드가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ODM·OEM 업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제품화할 수 있다 보니, 연구개발(R&D)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 시장 진출이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의사·약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화장품과 무관한 중소기업들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폐업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한국홍원은 2017년 해삼 마스크팩을 내놓고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지만, 매출 저조로 지난해 사업을 정리했다. 관절 영양제를 생산하던 오스테온도 2020년 탈모 샴푸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지난해 폐업했다.
매출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신규 브랜드가 늘면서 국내 책임판매업체의 총생산금액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책임판매업체는 2019년 1만5,707개에서 2023년 3만1,524개로 2배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생산금액은 1조6,263억원에서 1조4,510억원으로 10.8% 줄었다. 생산 실적을 식약처에 보고한 업체 비율도 2016년 60.7%에서 매년 하락해 2023년 37.6%까지 떨어졌다. 생산량 기준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전체 0.1%에 불과한 데 반해 10억원 미만 규모의 업체 비중은 2014년 90%에서 2023년 93.5%로 증가했다.
신생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품질 관리나 광고 윤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달 온라인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133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바르면 살이 빠진다', '세포 재생', '필러 효과'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표현이 다수를 차지했다. 품질이나 디자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인플루언서 A씨의 브랜드 블리블리 화장품은 피부 괴사, 두드러기 등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됐고, 스타일리스트 B씨가 판매한 아로마오일은 중소 브랜드의 제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책임판매업 규제에 단순판매업으로 몰리기도
한편 일각에서는 책임판매업체에 대한 높은 규제 부담이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자는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과 안전성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료 목록 보고와 관련 교육 이수도 필수다. 제도적으로 의무 사항이 많다 보니, 초기 자본과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는 자연스럽게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단순판매업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단순판매업은 별도 등록 없이도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데다 진입 장벽이 낮고, 시설·인력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단순판매업은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가 어렵고, 가격 중심의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일정 조건에서는 책임판매업자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유통 채널 측면에서도 대형 플랫폼 중심의 구조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식약처가 단순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원료 공개와 안전성 입증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만큼, 앞으로는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