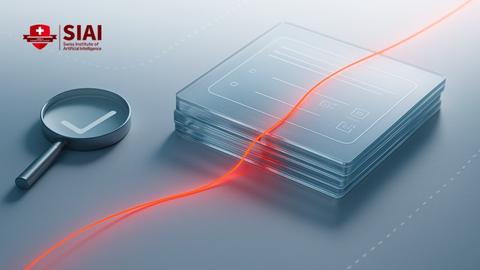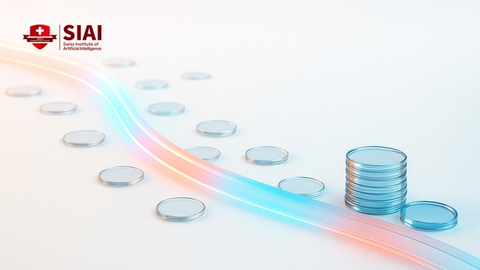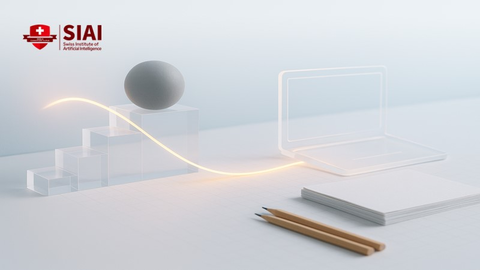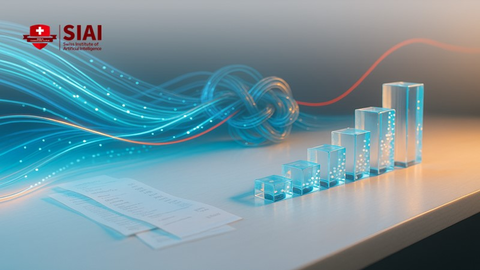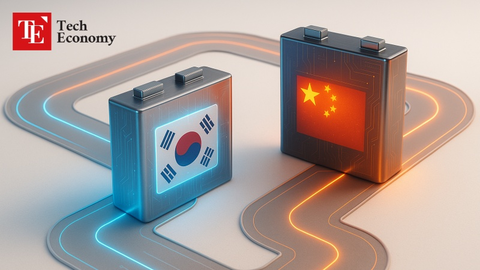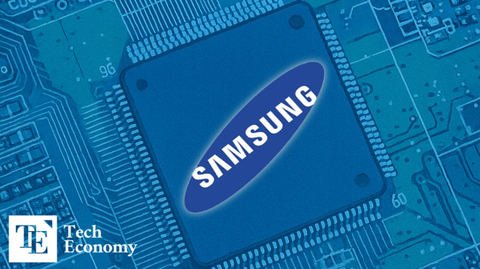우클릭 역풍 맞은 CNN, 비용 절감 위해 수백명 감원
입력
수정
CNN 체질 개선 착수, 수백명 칼바람 TV 편성 조정하고 디지털 전략 초점 트럼프 취임 후 디지털 혁신에 박차

‘뉴스의 제국’ 미국 CNN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주력으로 내세웠던 케이블 TV 방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스트리밍 플랫폼, 숏폼 콘텐츠 등을 선보여 디지털 환경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의식해 기존의 진보적 색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청자층 확장을 노리는 모양새다.
CNN 인력 감축, 제작 비용 절감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CNN은 이번 주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CNN의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CNN이 디지털 중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은 CNN이 기존의 전통적인 TV 편성을 조정하고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점점 더 많은 뉴스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TV 방송보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강해지자 재편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CNN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제작되던 일부 프로그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애틀랜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다만 CNN을 대표하는 유명 앵커 및 진행자들은 장기 계약이 체결돼 있어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CNN은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우클릭 시도'로 주 시청층 이탈
이처럼 CNN이 체질 개선에 나선 건 기존 케이블 방송 사업이 쇠퇴하고 시청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시청률 하락세의 주된 원인은 전 최고경영자(CEO) 크릭스 릭트의 ‘우클릭’ 시도다. 릭트는 “편향적인 보도를 줄이겠다”며 2023년 5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주자의 타운홀 행사를 독점 중계했다. 당시 행사는 트럼프와 CNN 진행자가 좌담하는 방식으로 중계됐는데, 300만 명이 시청한 방송에서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거나 ‘1·6 의회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이 끝나자 진보 진영에서 “왜 CNN이 트럼프에게 자기 주장을 펼칠 판을 깔아주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방송을 계기로 CNN의 전통적 시청자층으로 꼽히는 진보 성향 이탈이 심화되면서 트럼프를 출연시킨 릭트는 타운홀 행사 한 달 뒤인 6월 경질됐다.
CNN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CNN는 지난해 6월 트럼프와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첫 TV 토론을 주관했다. 이 TV토론에서도 트럼프는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 방송 이후 진보 진영에서 CNN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정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CNN 정치부 기자는 “우리가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내부에 널리 퍼졌다”고 지적했다.

유료화 재도전 CNN,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난관에 빠진 CNN은 디지털 유료화를 도입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월 3.99달러(약 5,700원)를 청구하기 시작했지만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마크 톰슨 CNN CEO가 꺼내 든 유료화 카드는 매달 구독료를 내는 시청자에게 사이트 내 무제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월’ 모델이다. CNN의 매달 순방문자 1억5,000만 명 규모다.
해당 모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불과 3년 전 CNN이 유료화에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출시한 유료화 서비스인 CNN 플러스(CNN+)에는 무려 1억2,000만 달러(약 1,717억원)가 투자됐음에도 고작 23일 만에 시장에서 철수하며 실패로 끝났다. 3년 전에는 유료화 시청자에게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이번에는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유료화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를 두고 비관론자들은 CNN의 시청자 평균 연령이 67살로 고령화돼 있고, 폭스뉴스와 MSNBC 등 경쟁 사이트가 무료라고 지적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CNN은 뉴스 기업 중 구독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고, 넷플릭스나 애플 TV 플러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과도 경쟁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에겐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더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