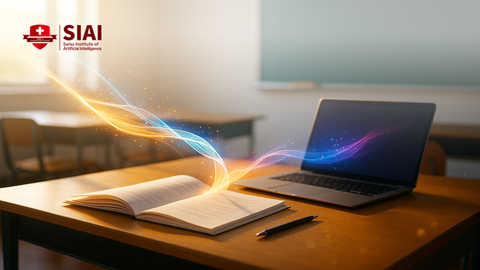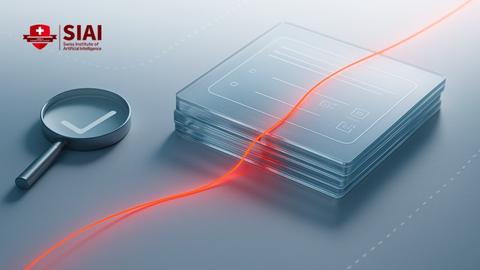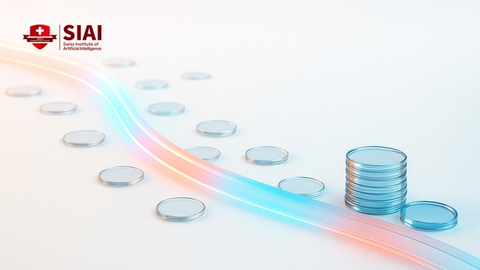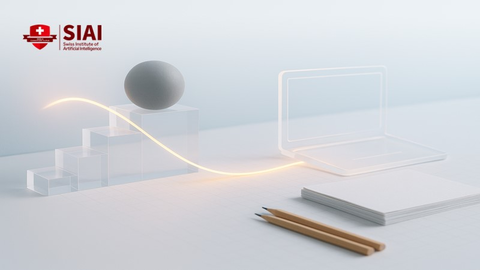美 '폭탄 관세'에 주춤하는 中 태양광, 한국·인도 웃는다
입력
수정
美, 관세로 中 태양광 우회 수출로 막았다 한화솔루션·OCI홀딩스 등 국내 기업 수혜 전망 태양광 수출 역량 확보한 인도도 '반사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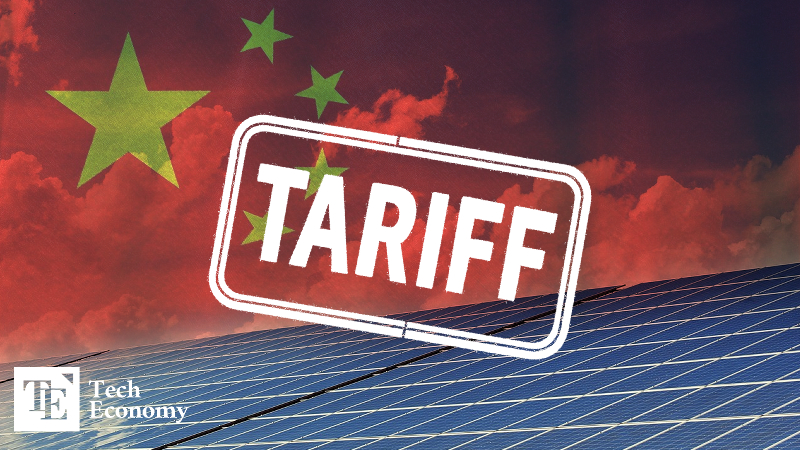
중국 태양광업계가 전례 없는 '생존 위기'를 맞닥뜨렸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막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를 부과하며 우회 수출로가 막힌 결과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축소됨에 따라 한국, 인도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동남아 태양광업계 '정조준'
27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충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다수의 중국 태양광 기업이 동남아시아 공장을 통해 미국의 관세를 암묵적으로 우회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활용해 이 같은 '허점'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미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면서 "상계관세 조사에서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막대한 관세 부담을 떠안은 것은 미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캄보디아 생산 업체들이다. 캄보디아 호넨솔라, 솔라 롱 PV 테크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은 반덤핑관세(117.18%)와 상계관세(3,403.95%)를 합쳐 총 3,521.14%에 육박한다.

韓 기업 시장 영향력 확대될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태양광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기술력과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점차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안정화 등 후속 투자가 뒷받침돼야 실질적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는 미국에 태양광 종합 제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꼽힌다. 솔라 허브는 한화솔루션이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생산 기지로,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 5단계(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중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4단계 제품을 단일 부지에서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둔 이 시설이 완성되면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을 갖춘 OCI홀딩스도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를 상호관세 면제 품목(HTSUS)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소재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온 OCI홀딩스는 직접적인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를 통해 연 3만5,000톤(t) 규모의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주에는 연 2GW 규모의 셀 생산 공장을 신설 중이다.
인도에도 '기회' 돌아가
인도 태양광업계에서도 미국 현지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도는 태양광 제품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시장 내 위치를 전환했다. 여러 국가가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중국' 전략을 채택하고, 중국의 대체국으로 인도를 주목하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인도 주요 태양광 업체들은 수출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와리 에너지, 아다니 솔라, 비크람 솔라 등 인도 태양광 3대 업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수출했다. 같은 기간 인도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태양광 모듈 수출액은 약 20억 달러(약 2조8,500억원)로 2년 전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들 기업이 온전한 자체 공급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변수다. 블룸버그NEF의 분석가 로힛 가드레(Rohit Gadre)는 “(인도 태양광업계의) 가장 큰 위험은 인도의 중국산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며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이 공급망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인도 태양광 제조업체는 중국의 1~2위급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조달받고 있다.
특정 제품에 편중된 생산 역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 인도는 태양광 모듈과 셀 생산 역량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나, 웨이퍼와 잉곳 제조 부문에서는 이렇다 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차후 기업들이 웨이퍼와 잉곳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해도 그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수급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