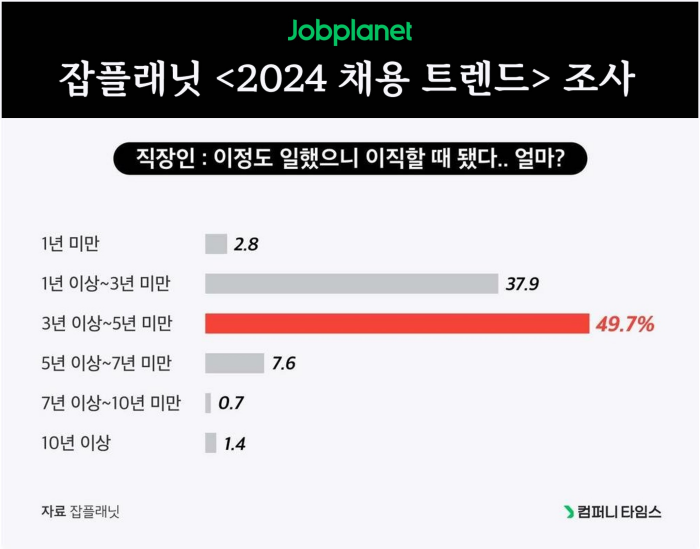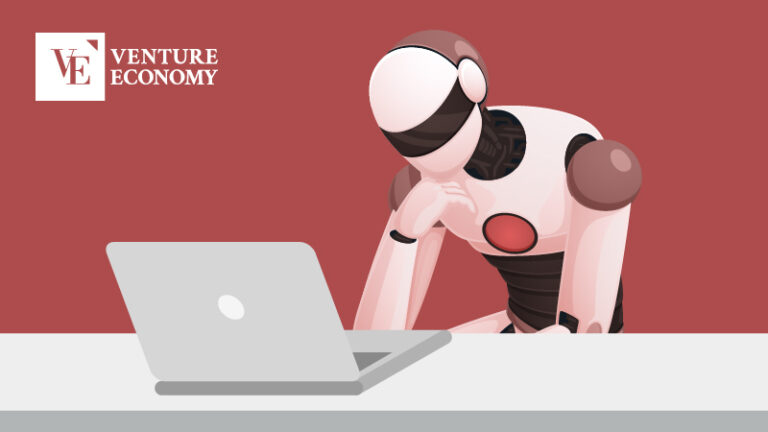세계 6위 수준 한국 R&D 투자, 삼성이 절반 이끌 때 나머지는?
전경련 “한국 R&D 투자, 상위 기업 편중 현상 두드러져” 적극적인 지원 약속 정부,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적극 활용 당부 고질적 문제점인 ‘인력 부족’, 단기 해결책 전무
세계 6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절반을 삼성이 도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투자액의 최근 8년 증가 폭은 2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같은 기간 10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한 중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지나치게 무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9.1%’ R&D 투자 가장 큰 손은 역시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R&D 투자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2021년 12월 현황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2,500개 글로벌 기업 중 미국 기업이 822개(32.9%)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기업이 678개(27.1%)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은 53개(2.1%)로 41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R&D 상위 2,500개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약 1조2,032억 달러(약 1,546조원)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 기업의 투자액이 약 4,837억 달러(약 621조7,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40.2%)을 차지했으며, 한국 기업의 투자액은 약 377억 달러(약 48조5,000억원)로 3.1%를 차지하며 41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2013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최초 집계인 2013년 12월 대비 국가별 현황에서 한국 기업의 R&D 투자 총액은 218억 달러에서 377억 달러로 약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9.6배 증가(224억 달러→2,155억 달러)했으며, 미국은 2.3배 증가(2,129억 달러→4,837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1%로 집계됐다. 2013년과 비교하면 0.5%p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같은 기간 1.2%p 증가했으며, 미국과 독일은 각 0.8%p, 일본은 0.7%p 증가했다.
이어 한국의 R&D 투자 집중도 분석에서는 상위 기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이 전체 한국 기업의 투자액 중 49.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1위 기업 의존도가 각각 6.3%, 7.6%, 10.0%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1위 기업 의존도가 20%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영국(21.7%)뿐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은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친 R&D 투자 활성화와 1위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대기업·주력 산업에 집중된 R&D 투자
이같은 R&D 투자 쏠림 현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난해 3월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R&D 투자 증감 추이를 살펴본 해당 조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가 연평균 6.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투자액의 84.0%를 차지하며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산업 부문별 투자 현황에서는 반도체, 화학, IT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에 대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61%에 달하며 전체 평균인 4.53%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간 R&D 투자액이 1조원을 넘은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삼성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LG화학 등 총 9곳에 불과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극소수의 대기업과 그 자회사들만 주력 산업 R&D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짜 문제는 인력 부족, 단기 해소 ‘불투명’
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산업 및 상위 기업에 집중된 R&D 투자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기업의 R&D 투자는 기술 발전으로 직결돼 종국에는 매출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 초반 R&D 투자 규모는 곧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살리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이달 11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R&D 투자 저변 확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데는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 투자나 세제 혜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 인력 때문이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연구 인력은 석박사급 연구·설계인력 1,000여 명을 비롯해 학사급 공정 인력 1,800여 명까지 총 3,000명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2020년 기준, 한국전지산업협회 조사), 제약바이오 업계는 연구 인력의 잦은 이동에 경쟁사 간 유인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까지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대규모 직접 투자나 세제 혜택 등과 달리 인재 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R&D 투자 쏠림 현상은 당분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될 전망이다.